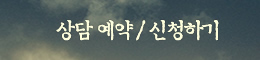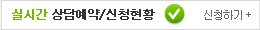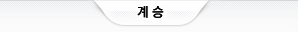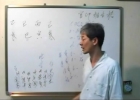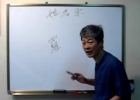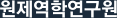용신과 희신
페이지 정보
본문
희신에 대한 박영창님의 의견
희신이 뭐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일설에는 용신을 생하는 것이라고 하고,
일설에는 꼭 生하지 않더라도 용신을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일설에는 꼭 生하지 않더라도 용신을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또 일설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용신을 희신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용신은 뭘까?
웃기게도 용신에 대한 정의마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용신에 대한 정의가 없는 마당에, 희신의 정의가 일치할 수 없다.
用神.
쓸 용, 귀신 신.
간단히 해석하면 쓰는 신이라는 것이다. 명리학에서 신이란 오행이라는 뜻이 가장 강하다.
그렇다면 용신은 뭘까?
웃기게도 용신에 대한 정의마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용신에 대한 정의가 없는 마당에, 희신의 정의가 일치할 수 없다.
用神.
쓸 용, 귀신 신.
간단히 해석하면 쓰는 신이라는 것이다. 명리학에서 신이란 오행이라는 뜻이 가장 강하다.
진짜 귀신을 뜻함이 아니다. 신처럼 조화를 부리기에 그런 글자를 붙인 듯하다.
용신이란 다시 말해서 <쓰는 오행>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초의 사주학 책인 <연해자평>에서는 <유용지신(有用之神)>, 곧 쓸모가 있는 신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그런데 일설에는 용신은 <월령용사지신>의 준말이라고 한다.
용신이란 다시 말해서 <쓰는 오행>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초의 사주학 책인 <연해자평>에서는 <유용지신(有用之神)>, 곧 쓸모가 있는 신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그런데 일설에는 용신은 <월령용사지신>의 준말이라고 한다.
오준민은 월령용사지신을 <월령分日용사>라고 정확하게 정의한 바가 있다.
월령에서 절입 후 며칠간은 월지 지장간 가운데 어떤 것이 사령하느냐를 구별하는 이론인 것이다. 여기서 용사하는 것은 당연히 인원이다. 인원용사인 것이다.
당연히 천간도 아니고 지지도 아닌 인원이다.
그런데...
그 사령하는 인원을 용신이라고 부르면서,
월령에서 절입 후 며칠간은 월지 지장간 가운데 어떤 것이 사령하느냐를 구별하는 이론인 것이다. 여기서 용사하는 것은 당연히 인원이다. 인원용사인 것이다.
당연히 천간도 아니고 지지도 아닌 인원이다.
그런데...
그 사령하는 인원을 용신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정해진 후에 희기를 가리는 작업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학설을 과장해서 강조한 사람이 일본인 아부태산이다.
용신(격국과 유사)이 있은 후에 희기(희용신과 기신)를 가리는 방식은
이 학설을 과장해서 강조한 사람이 일본인 아부태산이다.
용신(격국과 유사)이 있은 후에 희기(희용신과 기신)를 가리는 방식은
자평진전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고, 아부태산이 확립한 것인데,
아부태산은 자평진전 추종자이므로 순용 역용을 강조한다.
서락오가 명리서를, 명리 용어를 왜곡시킨 것보다 아부태산이 왜곡시킨 잘못이 훨씬 크다. 용신을 월령용사지신으로 정의하고, 그 후에 희기를 가리면서, 기존의 유용지신이라는 용신 개념을 삭제한 것인데, 자평진전을 너무 지나치게 추종하다가 그리 된 것이다.
자평진전과 아부태산의 용신 정의는 명리서 고서들의 전통에서 보면
서락오가 명리서를, 명리 용어를 왜곡시킨 것보다 아부태산이 왜곡시킨 잘못이 훨씬 크다. 용신을 월령용사지신으로 정의하고, 그 후에 희기를 가리면서, 기존의 유용지신이라는 용신 개념을 삭제한 것인데, 자평진전을 너무 지나치게 추종하다가 그리 된 것이다.
자평진전과 아부태산의 용신 정의는 명리서 고서들의 전통에서 보면
이단에 가까운 것이다.
그리고 월령분일용사지신과 투간은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항이다.
인원 사령과 인원의 투간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된다.
월령용사지장간이 투간할 수도 있고, 투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월령분일용사지신과 투간은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항이다.
인원 사령과 인원의 투간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된다.
월령용사지장간이 투간할 수도 있고, 투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투간이 없어도 사령지신은 있다. 언제나... 그리고 분일용사의 날짜 수 역시 고서마다 다르다. 서락오는 그래서 인원용사의 다과라는 항목에서 비교를 한 바 있었는데...
제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신이 월령용사라는 학설은 용신론에서는 소수설이다.(고서에서 볼 때)
2. 월령용사하는 인원을 용신이라고 정의한다고 해도,
제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신이 월령용사라는 학설은 용신론에서는 소수설이다.(고서에서 볼 때)
2. 월령용사하는 인원을 용신이라고 정의한다고 해도,
그것은 천간에 투간했느냐, 아니냐와는 별개의 문제다.
3. 용신의 고서의 정의는 다수가 <유용지신>이라는 의미이다.(연해자평, 적천수천미,
3. 용신의 고서의 정의는 다수가 <유용지신>이라는 의미이다.(연해자평, 적천수천미,
명리약언, 명리정종, 삼명통회, 기타 고서들에서)
4. 아부태산식의(자평진전식의) 용신 개념과 희기신 개념은
4. 아부태산식의(자평진전식의) 용신 개념과 희기신 개념은
서락오식으로 바꾸어야 고서의 전통에 더 적합하게 되고, 더 옳은 정의가 된다.
현대인의 용신 정의가 고서에서도 다수설이다.
5. 서락오의 실수는 자평진전을 고서의 전통에 입각한 다수설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다가 심효첨의 본래의 뜻을 변질시킨 잘못은 있으나, 명리학의 용어를 잘못 이해한 것은 별로 없다. 다만 통변 실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 아닐까?
이상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창 드림.
5. 서락오의 실수는 자평진전을 고서의 전통에 입각한 다수설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다가 심효첨의 본래의 뜻을 변질시킨 잘못은 있으나, 명리학의 용어를 잘못 이해한 것은 별로 없다. 다만 통변 실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 아닐까?
이상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창 드림.
출처 : 용신과 희신에 대한 박영창님의 의견 - cafe.daum.net/dur6fk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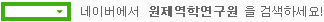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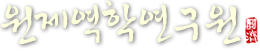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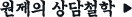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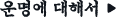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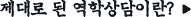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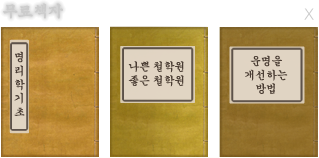






 010-2263-9194
010-2263-9194
 국민
국민